티스토리 뷰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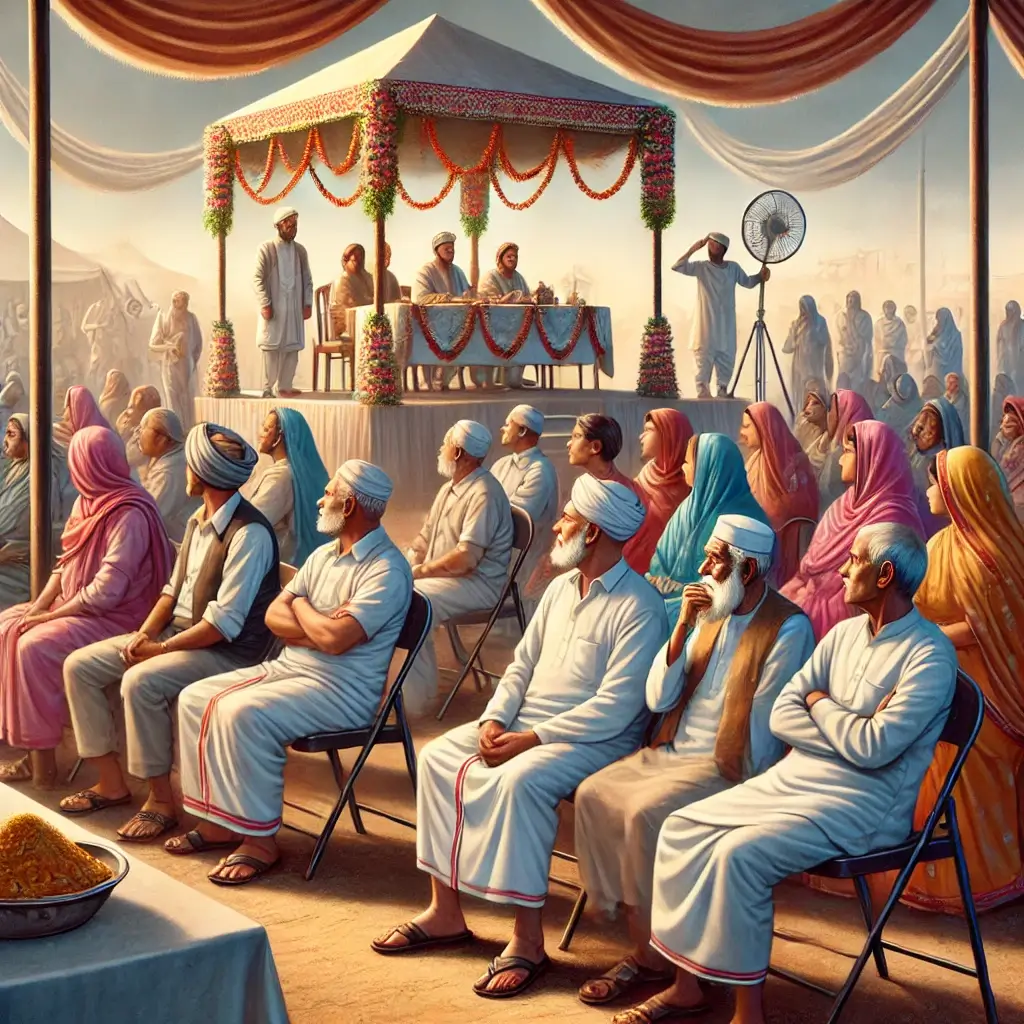
카스트 제도는 인도 사회에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위계적 구조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은 단지 외적·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되는 사회적 배제와 멸시는 정신적 고통을 누적시키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카스트 차별이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태,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차별이 내면화되는 순간, 자존감의 붕괴
카스트 차별은 종종 폭력이나 직업 제한, 교육 기회의 박탈 등 외형적인 문제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고 오래 남는 것은, 차별이 개인의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을 잠식해 가는 과정이다. 특히 어릴 때부터 "너는 안 돼", "너는 다르다"는 말을 듣고 자란 하위 카스트 출신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부정적 자기 인식은 학교, 직장, 지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강화된다. 같은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할당제 덕분에 온 사람"이라는 시선을 받거나, 대화 중에 느껴지는 경계심과 무시, 심지어는 직장 내 따돌림은 개인의 정신에 큰 상처를 남긴다. 특히 여성이나 성소수자와 같이 교차차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중·삼중의 정체성 억압을 겪게 된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환경은 만성적 스트레스 상태를 유발하며,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달리트 청년들 중 상당수가 진로에 대한 비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해 정신적 위기를 호소하고 있으며, 자살률 역시 인도 평균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정신 건강 문제가 당사자에게만 머물지 않고,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지역사회 내 소통 단절 등 더 넓은 사회적 불안정성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치유받지 못하는 고통, 침묵 속의 병
카스트 차별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한 이유가 있다. 바로,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병'이라는 점이다. 많은 달리트 커뮤니티에서는 정신적 고통을 부끄러움이나 약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고,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는 사치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는 곧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병원을 찾는다 해도 또 다른 벽이 존재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정신 건강 문제를 단순히 '성격 문제'로 치부하거나, 카스트에 기반한 편견을 가진 의료진의 무관심과 편견으로 인해 환자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신과 치료에 필요한 장기적인 접근성과 신뢰 형성이 어려워 치료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고통이 '침묵' 속에 머문다는 것이다. 차별을 받아도 말할 수 없고, 괴로움을 느껴도 드러낼 수 없는 환경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심리적 부담을 안긴다. 때로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마저 '내가 예민한 것일 뿐'이라며 무시하게 되며, 그 결과 감정 표현이 단절되고, 삶의 의욕 자체가 사라지기도 한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나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고립의 결과이다. 정신 건강이란 사회적 지지와 연결 속에서 치유되어야 하는데, 카스트 제도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셈이다.
마음을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희망적인 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NGO와 커뮤니티 기반 기관은 달리트 청년들을 위한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거나, 정체성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수용과 공동체 연대감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인도 내 일부 대학은 캠퍼스 내 정신 건강 센터를 확충하고, 차별에 따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온라인 공간 역시 대안이 되고 있다. SNS를 통한 익명 커뮤니티, 정신 건강 관련 유튜브 채널, 언어·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심리 콘텐츠들이 확산되면서, 자신이 겪는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멘털 헬스'에 대한 낙인이 줄어들고, 마음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약함이 아닌 용기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도 긍정적 변화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신 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를 통합한 통합 돌봄 모델이 실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특히 하위 카스트 커뮤니티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서비스 모델이 부족하고, 상담 인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정신 건강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문제다. 누구나 차별 없이 자신의 아픔을 말할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등이 실현되는 첫걸음이며, 카스트 없는 세상을 향한 치유의 시작이다.
